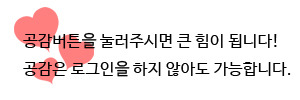바라나시 가는 기차 안. 아침 날씨가 퍽 추웠다. 침낭을 덮고 자고 있었지만 아침 7시 정도에 눈이 떠졌다. 자세도 불편하게 자고 인도 기차에서는 처음 자는 것이다보니 자다가 가끔씩 잠에서 깨곤 했다. 내가 일어 났을 땐 우크라이나 형님이 먼저 일어나있었고, 중국인 형님도 이어서 눈을 떴다. 우크라이나 형님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더니 우리에게도 한 장씩 주면서 기차 안에서 자면 먼지가 많으니 간단하게라도 얼굴을 닦으라고 했다. 얼굴을 슥슥 문지르니 물티슈가 살짝 까매졌다.
목이 칼칼했다. 먼지 많고 건조한 곳에서 자서 그런가보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청하고 있었고 가운데석에서 자고 있는 체코 할아버지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아래 칸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살짝 굽힐 수 밖에 없었다. 형님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복도에 울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짜이야 짜이야, 짜이야 짜이야."
짜이라는 음료를 파는 어떤 아저씨였다. 우리는 그를 짜이왈라라고 부른다. 인도 여행에 대해 알아보면서 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마셔보진 않았고 짜이왈라가 지나갈 때 그를 불러서 한 잔을 달라고 했다.
- 짜이 한잔 달라고 할 때는 "에끄 짜이 디지에"라고 하면 된다. 에끄(1), 짜이, 디지에(주세요). 한 개의 짜이를 주세요. 라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맛이 희한했다. 약간 밀크티 같으면서도 칼칼하다고 해야하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겨울 같은 날씨에는 짜이에 생강도 넣는다고 했다. 다소 추운 아침 날씨에 기차 속에서 짜이 한 모금을 들이키니 따뜻한게 들어가서 그런가 몸이 꽤 풀리는 기분이었다. 기차에서 마시는 짜이 한잔은 10루피(약 170원).
Upper Seat 였던 내 자리에서 본 기차의 모습. SL 클래스에는 한 구역당 복도를 기준으로 내가 있는 쪽은 6개의 자리가 있고 옆에는 Side Lower, Side Upper - 명칭이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난다 - 라고 복도와 평형으로 배치 된 2개의 침대가 있다. 이 때가 아침 7시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아직 단잠을 청하고 있었다.
짜이를 파는 짜이 왈라의 목소리가 정겨웠다. 복도에서 울려펴지는 "짜이야" 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기다려지기도 했다. 왠지 모르게 이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그리워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놨다. 이 영상을 틀면 나는 덜컹 덜컹 거리던 인도 기차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기차는 계속 달린다. 마지막으로 체코 할아버지들이 일어났다. 잘 잤냐는 간단한 아침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침대를 접고 다 같이 앉아 가고 있었다. 언제 청소 했는지도 모르는 얼룩진 창문을 통해 어떤 마을의 풍경이 보였다. 뉴델리의 엄청난 미세먼지에 비하면 바라나시 가는 길에 만난 파란 하늘은 놀라울 정도였다.
드디어 바라나시 정션역에 도착했다.
바라나시 까지 오는 기차를 같이 한 친구들에게 인사를 고했다. 바라나시 역에 도착하고 나서 같이 움직일까 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멤버들은 두 명씩 온 여행객들이라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고 나는 중국인 형님과 함께 릭샤를 타러 가기로 했다. 바라나시 정션역에 내려서 갠지스강이 있는 곳 까지 가려면 고돌리아까지 가면 된다. 릭샤 같은 경우는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내는게 아니라 타기 전에 릭샤왈라들과 얼마에 갈껀지 얘기를 끝내고 가는 것이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바라나시 정션역에서 고돌리아 까지는 60~80루피 정도면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릭샤를 잡으면 중국인 형님과 반 씩 나눠서 내기로 했다. 역시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릭샤 왈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는 무척 간단했다.
"Hey! 릭샤릭샤? 툽툽? Where are you going?" "고돌리아!!! How much?" 하면서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처음에 만난 릭샤 왈라는 200을 불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관광객이라고 너무 높게 부르려고 한다. 우리는 60을 불렀다. 그 가격에는 안된다는 릭샤왈라들을 하나 둘 씩 보내면서 200에서 150, 100까지 떨어졌다. 다들 이 이하는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그냥 고돌리아까지 걸어갈까 하면서 고돌리아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우리를 불렀다. 80루피에 고돌리아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결국 중국인 형님과 나는 둘이 합쳐서 80루피라는 확언을 받고 릭샤에 타기로 했다.
뉴델리에서는 너무 바가지를 쓸 것 같아서 릭샤를 타지 않았는데 이 때 처음 탔었다. 빠르게 달리는 릭샤 뒤에 앉아있으니 기분이 짜릿했다. 고돌리아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 그에게 80루피를 건넸다. 근데 릭샤 왈라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20루피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 참고로 20루피는 한국 돈으로 340원 정도 되는 돈이다. - 여기에 무슨 주차비가 있나. 진짜 한국돈으로는 껌도 못 사먹는 돈인데 어떻게든 바가지 씌울려고 거짓말 치는거 보면 짜증이 난다. 이럴까봐 100루피를 안 냈다. 우리는 그에게 딱 80루피만 건네고 갈 길을 나섰다. 기분 좋게 와서 마지막에 기분이 찜찜했다.
갠지스강을 찾아 가면서 지나갔던 어느 골목에서. 꽤나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혔는데 결국 그에게 이 사진을 주진 못했다.
처음 와보는 길이고 좁은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데 갠지스강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내 생각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는데 초행길이라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뉴델리에 비하면 소들이 엄청 많이 보였는데 소들이 많아서 그런가 거리에도 소똥이 엄청 많았다. 걸어다니면서 보이기라도 하면 조심조심하면서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갠지스강을 마주했다. 드디어 내가 사진으로만 보던 갠지스강을 와보는구나.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나라에 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갠지스강에 도착하니 무언가 가슴이 벅찼다. 살짝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하나. 무언가 해낸 기분이 들었다.
'갠지스강의 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내가 생각했던 갠지스강의 모습은 엄청 더럽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가는거라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갠지스강의 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그리고 강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목욕을 하는 사람부터, 빨래를 하는 사람, 앉아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사람 등등 별에 별 사람들이 갠지스강에 다 모여있었다.
바라나시로 오는 기차를 타기 전에 뉴델리에서 바나나를 12개 샀지만 다 먹진 않았고, 나는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오늘도 인도식은 도전하기가 두려웠다. 나는 레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하나 시켰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한식을 먹어야 할 것 같다. 입에도 잘 맞고.
아침도 먹었겠다 바라나시에서 지낼 숙소를 찾아나섰다. 레바 게스트하우스를 기준으로 뒷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 옴 레스트부터 인드라 페잉, 기타 페잉 같은 한국인들이 많이들 가는 숙소들이 여기에 몰려있다. 나는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싱글룸의 가격을 물어보고 다녔는데 게스트 하우스 앞 골목에서 죠티 페잉 게스트 하우스의 주인이 그냥 우리 숙소에 오라고 나를 불렀고 나는 그래,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죠티 페잉 게스트 하우스에 묵기로 했다.
이 날은 딱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레바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 판데이 가트의 계단에 앉아서 가만히 멍때리며 갠지스강을 구경하고 있었다.
계단에 가만히 앉아 갠지스강을 구경하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스케치로 남겼다. 애초에 나는 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림 그리는것 하고는 담을 쌓고 지낸 사람이라 스케치를 잘 하는 편은 아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내가 그린거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일뿐.
판데이 가트의 계단에서 내가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와서 구경하고 있던 꼬마애가 있었다. 내가 그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려봐라 저것도 그려봐라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난 그대로 그려줬다. 갠지스강에 물결이 치는 모습을 살짝 연필로 그었는데 그건 이 꼬마애가 그려달라고 해서였다. 꼬마애와 셀카를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엄지 하나를 척 들었고 나도 그 모습이 귀여워서 같이 엄지를 들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내 얼굴에는 웃음이 과도하게 들어찼다.
바라나시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두 명의 보트맨이 있다. 철수와 선재다. 나는 바라나시에 도착하기 전에 선재에 대한 이름은 듣지 못했고 철수의 이름만 들어봤었다. 철수의 보트는 하루에 두 번 갠지스강에 뜬다. 일출 때 한번, 일몰 때 한번. 나는 일몰 보트를 타기 위해 철수와 인사를 하고 그의 옆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일몰 보트가 출발하는 시간은 4시 반 정도인데 철수의 보트를 탄다고 연락이 온 한국인분들이 4시 반에 오지 않았다. 이 날은 왜 그랬는지 철수의 보트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나 혼자 밖에 없었다. 반면 옆에 선재네 보트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철수는 보트를 혼자 타면 돈도 많이 내야하니까 보트 타고 싶으면 지금 빨리 선재네로 가서 타라고 했다. 하지만 난 그러기는 싫었다. 철수에게 '돈 더 내고 타도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5시가 조금 안된 시간에 철수에게 연락했던 한국인 분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오는 길에 길을 잃어서 좀 늦었다고 했다. 오늘의 보트는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출발했고 바라나시의 해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철수의 보트는 바라나시가 왜 바라나시인지, 인도인들에게 바라나시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의 가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한국어로 설명해준다. 철수를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 철수가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면 그 때 그 때 답을 해준다.
붉은 빛 때문이었을까. 내 마음 속 어딘가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바라나시의 석양은 강렬하고도 아름다웠다. 이 날 철수의 보트를 탄 사람은 나와 한국인 두 분 이었는데 그 분들은 같이 여행하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바라나시의 석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철수가 내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점프샷을 해보라고 했다. 바라나시의 석양을 보면서 점프를 했지만 제대로 뛴게 아니라 엉거주춤 뛴 듯이 찍혔는데 그래도 퍽 괜찮은 포즈가 나왔다.
바라나시의 해도 안녕을 고했지만 보트 투어는 해가 저물어도 계속해서 진행됐다. 갠지스 강가의 건너편에서 석양을 본 이후에는 바라나시의 가트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유명한 갠지스강의 장례식도 볼 수 있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건 힌두교의 많은 신들 중에서 시바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아르띠 뿌자다. 이 의식은 매일 저녁에 드리는 것인데 인도인들에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벤트지만 막상 저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철수의 보트는 사람들이 많이 타면 1인 당 100루피를 내는데, 이 날은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아서 한 사람당 150루피씩 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레바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버니카페에 들려서 김치볶음밥을 하나 시켜 먹었고, 내일 일출 보트를 타기 위해서 일찍 잠을 청했다. 놀랍고도 신기했던 바라나시의 첫 번째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간다.
'위니의 여행이야기 > 인도,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의 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멍 때리기만 해도 재밌는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0) | 2018.02.22 |
|---|---|
|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간 바라나시에서의 하루 (0) | 2018.02.17 |
| 의도치 않았던 인도 뉴델리에서의 하루 (0) | 2018.02.10 |
| 뉴델리에서 맞이한 인도여행의 첫번째 아침 (2) | 2018.02.09 |
| 생각해본 적 없었던 인도 여행, 시작 (0) | 2018.02.08 |